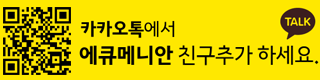- 서양미술로 신학하기_6
 |
| ▲ 산레담, <하를렘의 성바보교회 내부> (1628, 판자에 유채, 387×476cm, 게티센터, LA) |
플랑드르는 북해 연안의 저지대를 이름한다. 지금은 벨기에에 속해있으나 전에는 북해 서안의 저지대를 뜻하는 네덜란드의 17개 주 가운데 하나로 북유럽과 지중해와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르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예부터 중계무역이 번성하여 베네치아와 견줄 만큼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다. 특히 유럽 최대의 모직업이 번성하였고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1337~1453)의 배경이기도 하다.
이 지역을 아름 하는 네덜란드는 17세기 세계의 중심이었다. 면적은 한반도의 1/5에 불과한 작은 나라, 그것도 국토의 1/4은 해수면보다 낮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세계 최강 함대를 보유한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해양권을 독점했으며 동인도회사와 서인도회사를 세워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었다. 상업이 번성하고 교통이 발전하면서 자연히 문화 증진과 자유 시민계층이 형성되었다.
일찍이 루터와 칼뱅의 사상을 받아들여 도망자와 피난민과 자유사상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도피처였다.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1466~1536), 신학자 아르미니우스(1560~16090, 근대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카르트(1596~1650), 자유 철학자 스피노자(1632~1677), 자유주의적 조직원리로서 삼권분립을 주장한 존 로크(1632~1704), 《중세의 가을》로 유명한 역사가 요한 하위징아(1872~1945) 등 자유사상가를 배태하였고 음악에서는 요하네스 오케겜(1410?~1497), 조스캥 데 프레(1440?~1521) 등이 활동하였다.
미술에서는 후베르트 반 에이크(1385~1426)와 그의 동생 얀 반 에이크(1390~1441), 한스 멤링(1430?~1494)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는 결이 다른 플랑드르 미술을 이끌었다. 이런 풍토에서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루벤스(1577~1640)와 바로크의 거장 렘브란트(1606~1669)의 등장은 놀랄 일이 아니다. 후일에 고흐도 플랑드르 인근에서 등장하였으니 예술의 고장에서 예술의 장인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플랑드르 미술을 말할 때 빠트리지 말아야 할 화가 가문이 있다. 페테르 브뤼헐(1525~1569)이다. 그는 플랑드르 미술의 초기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쉬(1450?~1516)의 환상적 풍자화를 동판화로 모작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하였다. 큰아들 페테르 2세(1564~1636)는 아버지 그림만을 모작하였고 사인까지 똑같이 하여 후대의 연구가들은 원작과 구별하기 힘들게 하였다. 그의 아들 페테르 3세 역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작을 제작하였다.
당시 플랑드르에서 페테르 브뤼헐의 그림이 갖는 인기와 명성을 가늠할 수 있다. 꽃의 화가로 알려진 둘째 아들 얀 브뤼헐(1568~1625)은 루벤스와 공동작품을 제작하는가 하면 루벤스가 얀의 가족 초상화를 그릴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 얀의 아들 얀 2세(1601~1678)는 안토니 반 다이크(1599~1641)와 공방을 열어 아버지의 모작을 제작하였고, 얀의 딸 안나 브뤼헐(1637~1656)은 네덜란드 궁정화가 다비드 테니르스 2세(1610~1690)와 결혼하였는데 그녀의 아들 다비드 테니르스 3세(1638~1685)도 화가였다.
세대가 거듭되면서 재능이 쇠퇴하기는 하였으나 4대에 걸쳐 화가 가문의 길을 이었다는 점이 놀랍다.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돈과 직위가 아니라 재능과 성실성이다.
페테르 브뤼헐이 화가로 활동할 무렵 네덜란드는 신성로마제국 황제 합스부르크가(家) 카를 5세(1500~1558)의 아들 펠리페 2세(1527~1598)의 에스파냐 지배를 받고 있었다. 펠리페 2세는 이복누이인 마르가레타(1522~1586)를 네덜란드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에스파냐는 로마가톨릭교회의 맹주를 자처하며 영국의 종교개혁을 막고 프랑스 위그노전쟁에 군대를 지원하는 등 프로테스탄트에 대하여 무자비한 강공책을 펼쳤다. 네덜란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이미 루터와 칼뱅의 사상을 받아들였으므로 네덜란드 의회와 총독은 사사건건 부딪쳤다. 결국 1566년 펠리페의 강압적인 종교정책에 반기를 든 시민들에 의하여 성상파괴운동이 일어났다. 비텐베르크(1522), 취리히(1523), 뮌스터(1534), 프랑스(1566)에 비하면 늦은 편이다. 하를럼의 화가 페테르 얀스 산레담(1597~1665)의 <하를렘의 성 바보교회 내부>(1628)를 보면 교회 안의 내부 장식이 깨끗하게 비어있음을 알 수 있다.
에스파냐는 즉각 알바(1507~1582) 공작의 지휘 아래 1만 명의 군대를 파병하여 개신교도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이에 맞서 네덜란드 귀족 오라녜가(家)의 빌럼 1세(1533~1584)가 북부의 7주가 중심이 된 위트레흐트 동맹(1579)을 맺고 독립을 선언하므로 네덜란드와 에스파냐의 일대 격돌이 시작되었다.
페테르 브뤼헐은 이런 정국에서 활동한 화가이다. 근대화된 국가 개념이 생기기 이전이기는 하지만 네덜란드인이라면 누구라도 독립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브뤼헐은 이 무렵 화가 조합인 누가 길드의 회원으로서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돌아와 플랑드르의 안트베르펜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정치적, 외교적 격랑을 맞은 사회, 특히 에스파냐의 강한 군사력 앞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브뤼헐의 손끝을 통하여 이루어진 예술 창작은 어느 무기보다 강했으며, 고난에 처한 네덜란드 시민을 위로하기에 충분하였다. 개인의 재능이 공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런 배경에서 훗날 아브라함 카이퍼(1837~1920)의 ‘영역 주권론’이 등장한 것은 자연스럽다.
최광열(기독교미술연구소) webmaster@ecumen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