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석 강의』 22강
20여일 깊게 생각했던 다석은 2월 20일과 26일, 28일, 3월 1일(학생의 질문에 답한 글)에 걸쳐 ‘믿음’(信)과 자신의 유명한 말 ‘빈탕(空) 한데(與) 맞혀(配) 놀이(亨)’외 몇 편의 글을 『다석 일지』에 남겼다. 자신을 ‘생각하러 온 사람’이라 말했던 만큼 한 달 가까이 단식하며 사유하던 다석에게 떠올랐던 생각이었다. ‘하는’ 생각에 ‘나는’ 생각이 덧붙여진 귀한 글이다.
앞선 강의에서 허공(絶大空)을 강조했던 다석은 이제 본 강의 재목이 말하듯 허공과 인간 마음을 불이(不二)적 관계로 파악했다. 허공과 마음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말한 것이다. 이어지는 23강에서도 허공(빈탕)이 여전히 중심주제가 될 만큼 다석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이 장에 다석은 7개의 글을 쏟아놓았다. 글들이 길지는 않았으나 이를 각기 설명하다보니 이 강의에 가장 많은 지면이 필요했다.
< 1 >
앞서 말했듯이 본 강의는 얼마간 생각할 말미를 얻은 후에 쏟아 놓은 강의이다. 말미를 받는다는 것을 수유(受由)라 한다.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절대자로부터 ‘말미암’을 받아서 존재할 뿐이다. 절대자로부터 말미를 받아 사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다. 오랫동안 했던 일을 쉬고 다른 일을 시작할 때도 얼마간 말미를 받았다고 말한다.
이런 말미를 얻은 탓에 다석은 인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총 정리하여 설(說)했다. 본 강의의 제목인 ‘허공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기에 허공을 모르는 것은 모두가 거짓이란 말을 과격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꽃을 볼 때 테두리안의 꽃만 보고 그를 둘러싼 허공을 보지 않는 것은 인간에게 견물생심(見物生心)만을 일으킬 뿐이다. 주지하듯 다석은 성서를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대상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다석은 ‘허공이 곧 마음이다’란 자신의 확신을 ‘믿음’이란 시에서 설명하였다. 이를 한문으로 번역한 ‘信’이란 한시도 남겨두었다. 첫 한글 시부터 소개하겠다.
 |
< 2 >
 |
그렇다고 이를 보여 달라고 하면 그럴 수 없다. ‘하나’가 있다는 것을 나는 직감(直感)으로만 알 수 있는 까닭이다. 세상에는 ‘하나’를 증거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다석 자신도 ‘하나’를 전(傳)하는 사람이라 했다. 절대자인 ‘하나’가 내게 계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에게 사람으로 살라는 사명이 생겨날 수 있다. 사람으로 살라는 사명을 주신이가 바로 ‘하나’라 것이다. 하느님이 예수를 아들 삼았듯이 그렇게 우리도 ‘하나’의 아들로 불려졌다. 그 ‘하나’가 나를 내어 길렀던 까닭이다.
그래서 사람 노릇 제대로 하려면 항시 ‘그이’(하나)를 느껴야만 한다. 몸을 지닌 까닭에 수성(獸性)에 빠질 수 있음에도 말이다. 예수도 자신을 독생자, 곧 ‘하나’의 아들로 느끼며 살았다. 독생자란 자신이 오직 ‘하나’의 아들임을 깨닫는 관계를 일컫는다. 한마디로 예수만이 독생자가 아닌 것이다.
‘그 일르시믄 때를 히스미오’. ‘하나’가 이르시는 말씀은 귀로 들리지 않는다. 소리 없는 소리를 우리는 오직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을 뿐이다. 마음은 귀가 없으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聽無聲). ‘하나’가 이르신 말씀은 ‘때’이다. 시간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르신 때(순간)를 이어이어 온 것이 바로 시간이다. 다석의 경우 1957년 3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 ‘하나’가 이를 알렸(命)기에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시간은 항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시킨다(時者命也). 우리에게 사람노릇 하라고 정신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을 다석은 매순간 느끼며 살았다. 이를 그의 제자 김흥호는 ‘시간제단’(時間劑斷)이라 불렀다. 이를 위해 ‘하나’는 ‘말미’를 준다. 숨 끊어질 때까지 말미를 얻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사람이다. 더 길게 말하면 인류가 생기기 전부터 모두 없어지는 순간까지가 우리들 말미일 것이다.
여기서 ‘히스미오’는 ‘이슴이오’라고도 읽어도 좋다. ‘이슴’은 남쪽지역에서 ‘이어간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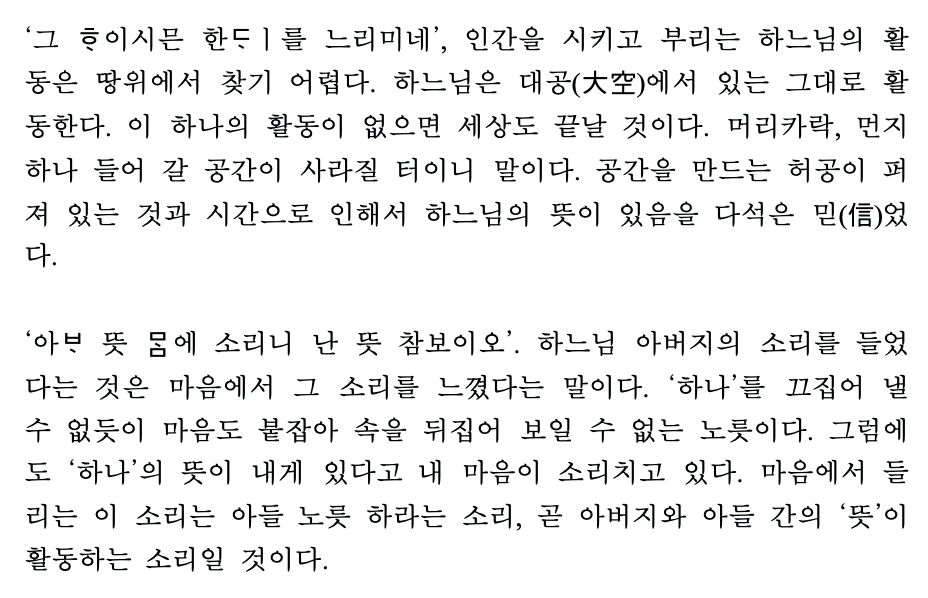 |
우리들 마음에서 거듭 ‘하나’의 뜻이 생기(生起)한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래서 마음의 뜻과 ‘하나’의 뜻이 같을 수밖에 없다. ‘하나’는 가장 큰 나인 까닭이다.
내 마음 속의 나는 하느님의 한 뜻이다. 방탕한 자식은 하나와 뜻이 다르겠지만 ‘하나’를 느끼는 이는 그와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라는 존재가 나온 것이다. ‘난 뜻 참 보이오’는 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는 뜻이다. 사람이 마음속에서 무엇을 깨달아 얻었다면 그것을 덕(德), 곧 ‘속알’이라고 할뿐이다.
‘속알이 말슴으로 품기우니, 참 말슴 스매, 짹堧 번듯ᄒᆞ여이다’. 속알이 말씀이란 것, 말씀에 하나의 ‘속알’이 들어 있다는 것은 아무리 다른 말로 불려도, 다른 종교의 언어로 말하여도 서로 통할 수밖에 없다. 속알이 들어 있을 때만 그것이 말씀이 되는 까닭이다. 이점에서 속알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통하는 성령의 언어라 불려도 좋겠다. 참 말씀이 가슴속에 진리로 성립되었다는 것이 ‘참 말슴 스매’가 뜻하는 바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넘나드는 길이 구김 없이 번듯한 ‘짹’이 되었다. 다석은 바로 이런 사실 전부를 온전히 믿었다. 이런 내용을 번역한 것이 이하의 한시 ‘信’이다.
< 3 >
한시 ‘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존재여인생자(一存在與人生子)’. 없이 계신 존재인 ‘하나’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의 관계로 아주 가깝다란 뜻이다. 유명시시천행공(唯命是時天行空), 오직 나에게 명령하는 것은 시간뿐이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은 공간이다.
‘부지심음성의시(父旨心音誠意示)’. 말씀을 이룬 것이 성(誠)이듯이 말씀 언(言)에 하나(一)을 더한 것은 ‘소리 음(音)’이다. 또한 마음의 소리는 성의(誠意)가 된다. 음(音)+심(心)이 뜻(意)이 되기에 말이다. 하느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살아내야 할 뜻으로 나타난다는 말이겠다. 진리를 내포한 마음의 소리가 바로 ‘뜻’이다. 이렇게 다석은 성(誠)을 언(言)+ 성(成, 聲)으로서 마음의 소리로 풀었다. 우리말 언성(言聲)을 언(言)+성(成)의 언성과 같이 본 까닭이다.
< 4 >
‘회덕성언지도공(懷德成言至道公)’. 말씀이 속알(德)을 품었기에 참 말씀(成言)이 성립하여 도에 이르렀고 그런 탓에 사사로움이 없어졌다(公). 여기서 지도(至道)는 앞서 말한 ‘짹’을 뜻한다. 이상의 내용이 다석이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였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았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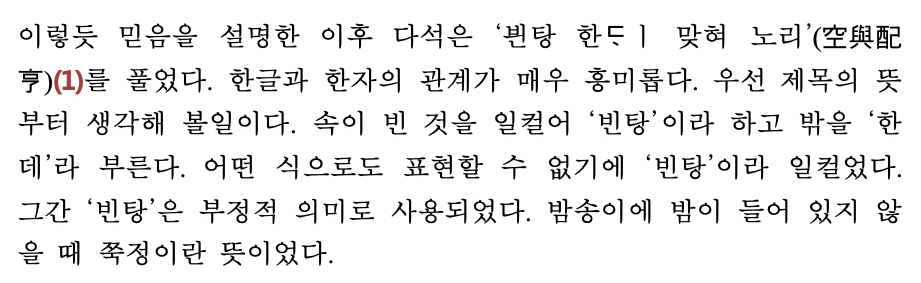 |
사람들은 아무리 적은 것일 지라도 자신 혀(舌) 끝에 닿아 맛을 느끼는 실(實)만을 좋아한다. 그러나 다석은 이것을 오해이자 큰 잘못이라 여겼다. 기독교 서구가 있음(有)만 강조하고 없음(無)에 대한 이해가 일천한 것도 같은 맥락이겠다. 다석에게 허공(無)은 일체 있음(有)의 근거였다. 세상에 ‘빈탕’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고 확신했다. 이것이 그의 믿음(信)의 뿌리였음을 앞서 보았다.
다석에게 빈탕은 ‘공공허허대대실’(空空虛虛大大實)이다. 공하고 공한 것이 세상의 어떤 큰 것 이상으로 실(實)한 것, 확실한 것이었다. 이 ‘하나’의 활동보다 확실한 것이 없다. 주지하듯 시간은 바로 ‘하나’의 활동이다. 시간처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을 것인가?
‘한데’는 밖을 말한다. 어머니 품안에 머물면 평안하고 그 품이 사라지면 허전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한데’는 종종 쓸쓸한 곳, 황량한 곳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좀 더 큰 나(大我)를 알 필요가 있다. ‘한데(外)’ 없이 ‘안(內)’이 존재할 이치가 없다. 지구 밖을 나가면 더할 나위 없이 너른 공간이 펼쳐진다. 그 시원함과 웅장함을 누구라도 경험하길 원할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한데’를 필요로 한다.
이 ‘한데’를 거듭 찾아 가는 것이 인간의 의지적 삶의 모습이다. 아무리 춥더라도 아이는 밖으로 나가서 놀아야만 한다. 이런 ‘한데’를 자꾸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인간은 ‘하나’의 자녀로서 허공 속에 존재하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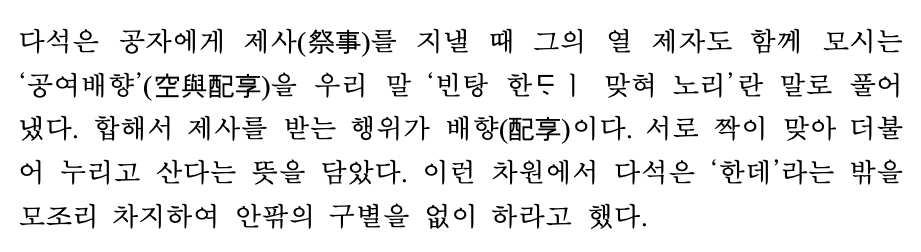 |
그렇게 되면 ‘한데’는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된다. 그래서 빈탕과 한데는 여(與), 즉 이 둘이 같아 질 수밖에 없다. 빈탕인 공(空)이 안팎이 하나 되는 ‘한데’와 같게 된다는 것이다. ‘맞혀’는 맞혀 간다는 뜻이다. 더불어 짝을 맞춰(配)를 만난다는 의미이다.
다석은 종종 빈탕과 한데처럼 서로 짝을 이루는 우리말들을 많이 소게했다. ‘맛, 맞, , 맡’과 ‘낫, 낮, 낯, 낱’이 서로 만나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예는 앞으로 소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리’는 제사의 뜻을 지녔다. 물론 유희(놀이)라는 의미도 있다. 아이들이 놀이에 심취하듯이 한 세상 취해서 살자는 것이다. 제사가 놀이인 것이 의미 깊은 발상이다. ‘하나’에 맞혀 사는 것이 놀이이자 제사인 셈이다. 결국 ‘공여배향’은 빈탕 한데에 맞추어서 놀자는 것이다. ‘하나’인 하느님을 모시고 늘 제사를 지내는 마음으로 살라는 말이겠다.
< 5 >
이제 이 시(詩)의 구절들을 풀어 보겠다. ‘나(我) ㄹ(飛) 수없는, 붙(着) 닫힌(閉塞) 몸둥이(束縛), 맷달린 나, 읠(얼)이 묻언(染埋), 꿈틀더니’. 날 수 없는 나, 아(我)는 바로 일상적인 자신이다. 책임지는 일 없이 자신의 호불호(好不好)만을 내세우는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 책임감을 통해 자유와 평등세상이 이뤄질 때 비로소 날 수 있는 내(我)가 가능하다.
하지만 나를 책임지는 일이 쉽지 않다. 더구나 위(上)로 비상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면서도 나는 ‘나 노릇’ 하며 살고자하나 내 노릇 못했기에 나는 날 수가 없다. 여기서 얼은 무던한 우리 정신을 말한다. 옳은 정신이라 말해도 좋겠다.
그 얼이 우리 몸에 갇혀 붙잡혀 있었기에 오히려 더럽혀졌다(染埋). 그래서 드러나지 못한 채 묻혀 있었다. 얼이 묻혀서는 결코 날수 없는 법이다. 그러나 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얼이 빠졌으나 완전히 실종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묻힌 상태로 조금씩 살아 꿈틀 거리는 것이 바로 얼이다.
다석에게 이런 얼이 무던하게 보였다. 꿈틀거리다는 이런 저런 꿈을 꾼다는 의미이다. 조금씩 작동하는 얼로 인해 별의별 꿈들이 가능한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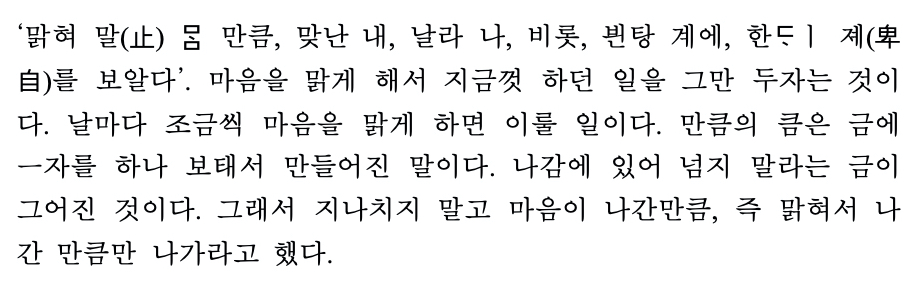 |
몸은 날 수가 없으나 맑혀 나간 마음은 무한히 날아 갈 수 있다. 이런 마음과 허공이신 ‘하나’, 이 둘이 만나서 종래 마치자고 해서 ‘맞난 내’(我)라 썼다. 자기 마음으로 종국에 절대이신 하느님을 만나라는 것이다. 맞날 것을 만나고 그와 맘껏 통해야 비로소 내가 날(飛) 수 있게 된다.
그렇기에 모두가 ‘하나’와 만나 정신(얼)이 자유로운, ‘맞난 내(我)’가 될 일이다. 지금껏 갇혀 있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이 빈탕과 어울리지 못하면 높은 곳, 허공 계신 하느님을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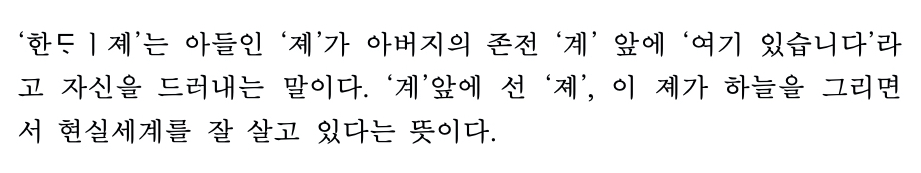 |
첫 번째 행이 감옥에 갇힌 상태를 말한다면 2째 행은 자유, 해방을 적시한다. 마지막 종장은 이 시의 결론이 될 것이다.
 |
그렇기에 다석은 지속적으로 위로 오르고자 애썼다. 그러나 올라가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오는(來)것이기도 하다. 올라간다는 것은 올 나(我)를 찾는 일이다. 거듭 오르면 내가 내게 이를 수 있다. 하느님 나라가 내안에서 이뤄졌다고 말해도 좋겠다.
‘내 깃븐’은 내 분수란 말이다. 자기 깃(분수)를 찾아 알면 기쁜 일이다. 기쁨이 거듭되는 상태를 갈지(之) 두 개를 겹쳐서 표현했다. 이런 기쁨을 느끼는 것이 인생을 사는 맛이라는 것이 다석의 결론이자, 이 시(詩)의 핵심이다.
< 6 >
다음은 물질과 정신(마음)을 주제로 한 ‘몬(物)에 맘(心)’이란 시이다. ‘밖앗 몬이 속으로 들어가서 ᄆᆞᆷ에 빛외어 보이믄 속알 밝으미오’. 이 말은 과학에서 말하는 표상을 상기시킨다. 밖의 자연과 물건이 내속에 들어가서 투영될 경우를 지칭한다. 어떤 구차함 없이 있는 그대로 자연 현상이 비쳐 보이면 우리들 속알이 밝아진다고 했다. 이것이 빈탕 마음을 만들고 유지하는 길이다.
 |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 말하듯 마음이 일어나면 사람이 변질되기 십상이다.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면 욕망이 일어나는 탓이다. 다석은 소주(所住)와 생심(生心)의 관계에서 비롯한 결과물로서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을 들었다. 이런 연유로 ‘견물불가생’(見物不可生)을 강조했다. 물건을 보고도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다. ‘응무소주’(應無所住), 마음이 응해도 결코 그곳에 머물지 말라고 하였다. 소리, 향기, 맛, 보들보들한 감촉, 심지어 법(法)에도 생심(生心)하지 말라 한 것이다. 좋고 달콤한 기복적, 상투적 말들이 얼마나 주위에 넘쳐 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로지 ‘빈탕 한데’에 우리들 마음을 정해야 옳다. 마음이 일어나서 장난치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줄 신뢰의 그루터기, 그것이 바로 ‘하나’(빈탕)이다.
‘두릴손 속이 어둘가 살어날가 몬에 ᄆᆞᆷ’, 두릴손은 무서운 것이란 뜻이다. 속이 어두워져 마음이 밖으로 나가서 물건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두렵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위로 오를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성서에도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질까를 삼가라’(누가복음 11:35)고 했다.
‘이몸 누리, 올나 노리’. 이몸 누리는 이 세상(누리)이 곧 몸이란 뜻을 담았다. 세상 역시 혈과 육으로 된 몸뚱이와 같다고 여긴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인간은 날 수 없고 종내는 눕게 만든다. 그러나 올라가는 나(올나)는 춤추며 놀면서 위를 향한다. 빈탕하데를 향해, 그에 맞추어서 모두가 함께 놀자(配享)는 것이 ‘올나 노리’이다. 이것이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성서적 예배(제사)의 의미라 하겠다. 나를 세상(몸)에서 끄집어내어 ‘하나’ 앞에 맞혀 내 마음을 맑혀서 맑힌 만큼 놀이(제사)하자는 것이다.
다석은 이를 신세여향(新歲予享)이란 한 말로 축약했다. 나란 사람은 드러눕는 몸이지만 동시에 놀이를 하며 올라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어두운 속을 자꾸 밝혀 나가는 것이 놀이이자 제사인 것을 다석은 거듭 강조하였다. 이것이 고자가 말했던 배향(配享)의 본뜻이다.
< 7 >
 |
‘드려 올려 Y로 올나가미 좋은 것이다’. 자신의 자리를 들고 위로 올라가는 일이 제사이고 예배이다. ‘하나’인 그와 맞혀 놀이 하면서 오르는 일이다. 오르다가 미끄러지는 일이 허다할 것이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하느님께로 올라가고자 거듭 노력해야 옳다. 그에 의해 들어 올리어 들어가야 한다. 이것만이 좋은 일이다.
‘집으로 드러가서, 지친 몬을 눕히는 것도 새 목숨을 얻으려고 쉬는 것이요’. 말 그대로 집에서 쉬는 것도 새 힘을 얻고자 함이자 눕는 것 자체를 목적하지 않는다. 새 정신을 얻기 위해 쉬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집과 드러눕는 일 자체를 좋아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밖으러 나가서 먹을 것을 거더 드리는 것도 불 살러 칼로리를 얻자는 것뿐’. 먹을 것을 밖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칼로리를 얻고자 함일 뿐 먹는 것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다.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으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으면 상관이 없다.
‘그런 것들은 사는 일만도 죽는 일만도 아니다’. 어느 순간 몸뚱이는 드러눕고 만다. 죽음을 맞는 것이다. 그러나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몸으로는 죽으나 얼로 살 수 있기에 말이다. 몸으로만 사는 것은 종내는 죽는 일이다. 그렇기에 몸으로 죽는다, 산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가로 들락날락은 바로 나드리는 못 된다’, 밖의 것을 안으로 가져오는 것만으로 온전할 수 없다. 안팎을 뛰어 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본질이다. 들고 나는 일에 있어 더욱 철저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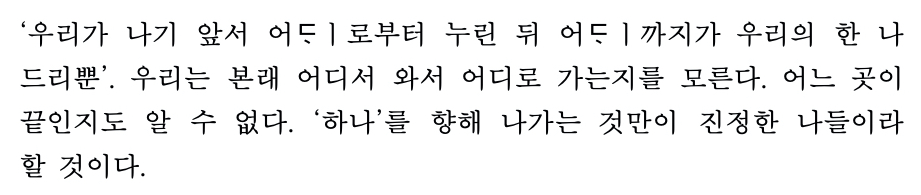 |
‘않으로 드러서도 속알을 밝히미 Y로 계에 드림과 알로서 졔로 올 나가마’. ‘하나’를 향해 오르면서 마음속의 속알을 밝히고 위, 곧 그의 존전인 ‘계’에 제사를 드리고 아래로는 ‘졔’하며 올라가야한다.
 |
< 8 >
이런 마음으로 다석은 2월 28일에 마지막 시 “말슴 듣는 우에(이몸 누리, 올나 누리)”를 썼다. ‘듣웨 속알 밝힐네’,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중에 우리는 속알을 밝힐 수 있다. 위(上)의 말씀을 듣고 자기 속알을 밝히는 존재가 바로 나여야 한다.
‘나와 속이 어둘가’. 마음이 밖으로 나와 물(物)과 접촉하면 속알이 어두워지니 그것이 밖을 향하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두라는 뜻이다. 말씀을 듣고 자기 속에서 말씀을 밝히면 마음이 밖을 향하지 않을 것이다.
‘죽어 노리 살 누리’. 어둠을 벗고 위로 오르면 본래 진리에 닿을 수 있다. 죽으면 우리들 몸, 육신은 땅에 눕게 된다. 살(肉)을 갖고 살지만 결국 그 살은 어 사라지고 만다. 이것으로는 노리(제사)를 할 수 없다. 배향(配享)이 불가능한 탓이다. 세상에서 마음을 단단히 하여 육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그것이 사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되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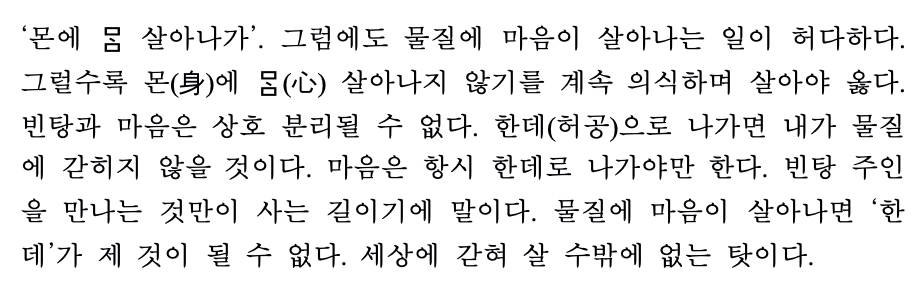 |
이런 다석의 가르침에 대해 질문이 있었던 모양이다. 질문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추측컨대 세상에 살면서 어찌 마음을 물질에 두지 않고 살 수 있겠는지에 대한 물음일 것이다. 이에 대해 다석은 ‘여공배향기삼’(與空配享其三)이란 말로 단호하게 답했다. 허공은 일체를 감싸고 포함한다. 일체를 감싸는 일에는 차별이 없다.
하지만 허공 아닌 것은 모두들 포괄 하지 못한다. 허공을 잃었기에 차별이 비롯한다. 허공의 덕(德)은 그 안에서 참 자유하다는 데 있다. 허공이 참여하지 않은 곳이란 도무지 없다. 모든 물질사이에도 허공이 작용한다. 이 허공은 내 마음과 더불어 ‘하나’(하느님)에게 들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한한 진리에 자신을 던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다석은 허공을 통해서 물질계, 상대적 세계를 넘어설 것을 다시 역설했다.
미주 |
| (미주 1) 필자는 이 제목으로 단행본을 출판한 적이 있다. 『빈탕한데 맞혀 노리-多夕으로 세상을 읽다』(서울: 동연, 2011) |
이정배(顯藏 아카데미) ljbae@mtu.ac.kr







